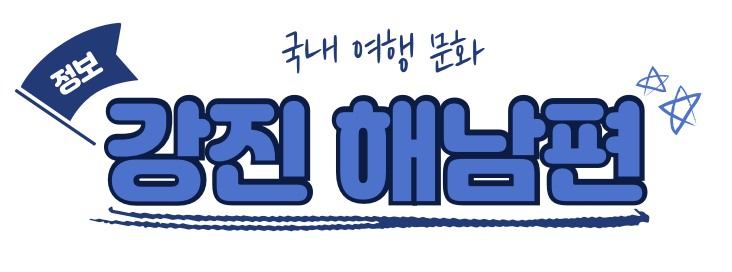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류의 유적지 관련 책인데요
관련해서 나중에도 찾아볼 수 있게 제 기준으로 가볍게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링크타고 넘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강진 해남 1탄 시작하겠습니다.
월출산 도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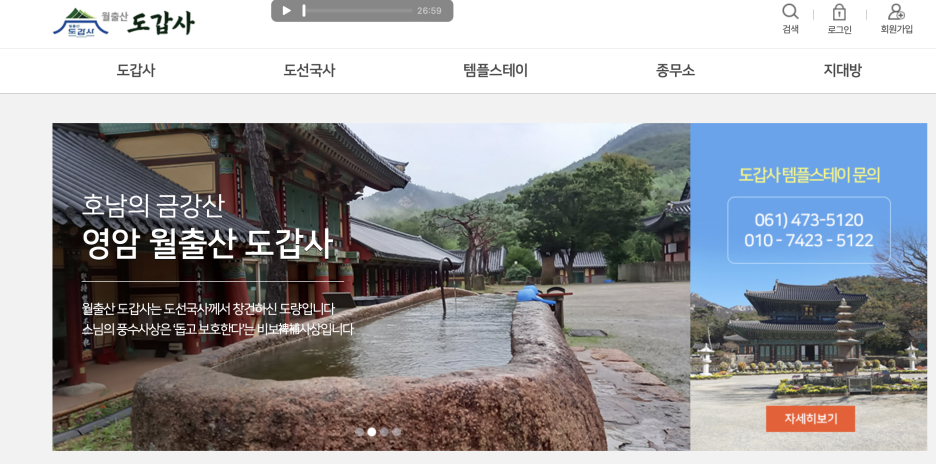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에 있는 절이다. 1984년 2월 29일 전라남도의 문화재 자료 제 79호 지정되었다.
도갑사는 신라의 4대 고승 가운데 한분인 도선국사가 신라 헌강왕 6년에 창건했다.
국보 제50호인 해탈문과 보물 제89호인 석조여래좌상은 후세에 길이 남을 미술품이며, 이밖에도 귀중한 문화재가 많이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도갑사 관음32응신도
관음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서른 두가지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타나는 모습을 그린 불화. 응신도 · 관음응신도 · 관음삼십이응신탱.
조선 중기의 불화. 비단 바탕에 채색. 세로 235㎝, 가로 135㎝. 일본 경도 지온원 소장. 1550년(명종 5) 인종비 공의왕대비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양공을 모집, 이자실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여 도갑사 금당에 봉안한 것이다. 명문의 내용이 확실하고, 또한 현존 유일의 32관음응신도인 점이 주목된다. 원본은 일본 경도 지온원에 소장되어 있고, 모사본은 전라남도 도갑사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월남마을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월남사터이다. 창건연대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려시대에 진각국사(1178∼1234)가 세운 것으로 되어있지만, 경내 삼층석탑의 규모나 양식으로 보면 그 이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폐사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나 이 일대의 절이 정유재란 당시 병화로 소실되고 ‘무위사’만 남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정유재란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양쪽편으로 삼층석탑과 진각국사비가 있다. 최근에 삼층석탑 근처 민가에서 석탑의 지붕돌이 발견되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는 2개의 석탑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발견된 지붕돌의 세부기법이 월남사터에 있는 백제계 양식인 삼층석탑과는 다른 신라계 양식의 기법이라는 점이다. 한 절터에서 백제계 석탑과 신라계 양식의 석탑이 함께 자리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각국사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진각국사비는 비석의 위쪽이 깨져 없어졌고, 앞면 일부도 떨어졌으나 남아있는 바닥돌과 거북의 기세, 비석의 폭으로 보아 매우 웅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곳에는 금당터 초석, 축대가 남아있으며, 옛 기와, 청자, 백자조각이 츨토되고 있다.
출처: 국가유산포털

무위사는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원효대사가 관음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은 절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름도 무위사로 바뀌게 되었다.
이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극락보전은 세종 12년(1430)에 지었으며, 앞면 3칸·옆면 3칸 크기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짜은 구조가 기둥 위에만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조각이 매우 세련된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삼존불과 29점의 벽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상 뒤에 큰 그림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 28점은 전시관에 보관하고 있다. 이 벽화들에는 전설이 전하는데, 극락전이 완성되고 난 뒤 한 노인이 나타나서는 49일 동안 이 법당 안을 들여보지 말라고 당부한 뒤에 법당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49일째 되는 날, 절의 주지스님이 약속을 어기고 문에 구멍을 뚫고 몰래 들여다 보자, 마지막 그림인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그리고 있던 한 마리의 파랑새가 입에 붓을 물고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림속 관음보살의 눈동자가 없다.
이 건물은 곡선재료를 많이 쓰던 고려 후기의 건축에 비해, 직선재료를 사용하여 간결하면서 짜임새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 조선 초기의 양식을 뛰어나게 갖추고 있는 건물로 주목 받고 있다.
출처: 국가유산포털
무위사 극락전 내벽사면 벽화
무위사 극락보전에 있는 조선시대의 벽화이다. 2001년 8월 3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315호로 지정되었다.
동측 내벽 중앙의 삼존불화와 서측 내벽 중앙의 아미타래영도를 비롯한 29점은 현재 모두 해체되어 보존각에 보관 및 진열 중에 있다.
이들 벽화중 삼존불화와 아미타래영도 2점과 15세기 추정의 관음보살도, 당초문도 2점 등 4점은 지금껏 발견된 불교벽화 가운데 가장 앞선 것들로, 고려식 조선 초기 불화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극락보전 후불벽 앞면에 그려져 있는 아미타삼존불벽화이다. 앉은 모습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에 관음보살이, 오른쪽에는 지장보살이 서 있는 구도를 하고 있다. 화면의 맨 위부분에는 구름을 배경으로 좌우에 각각 3인씩 6인의 나한상을 배치하고 그 위에는 작은 화불이 2구씩이 그려져 있다.
아미타극락회도 장면을 그린 이 벽화는 앞에 모셔진 아미타삼존불상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중앙의 본존불은 비교적 높은 연꽃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으로 양어깨를 모두 감싼 옷을 입고 있으며 뒤로는 키모양의 광배가 표현되었다. 왼쪽에 서있는 관음보살은 머리칼이 어깨 위에 흘러내린 모습에 얇고 투명한 겉옷을 입고 있으며, 오른쪽의 지장보살은 오른손으로 석장을 짚고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채색은 주로 녹색과 붉은 색을 사용하였다.
조선 성종 7년(1476)에 화원 대선사 해련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벽화는 온화한 색채나 신체의 표현 등 고려시대의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간결한 무늬나 본존불과 같은 크기의 기타 인물 표현 등 조선 초기 불화의 새로운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어 고려식 조선 초기 불화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국가유산포털
그럼 2탄에서 뵙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핑 맛집 여행 > 국내여행 및 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내여행 문화] 경주 3탄 (+강원도) (0) | 2025.02.09 |
|---|---|
| [국내여행 문화] 경주 2탄 (0) | 2025.02.05 |
| [국내여행 문화] 경주 1탄 (0) | 2025.02.04 |
| [국내여행 문화] 충청남도 (0) | 2025.02.03 |
| [국내여행 문화] 강진 해남 2탄 (1) | 2025.01.14 |



